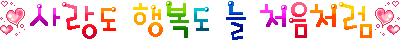♣ - 세(歲) 밑에 서서 - ♣
새벽하늘을 바라보며
굳게 여미던 시간들이
어느새 한 해의 길목을
빠져나가고 있다.
저문 날,
땅거미 짙게 깔린 저 들길을 걸어
아린 그림자 길게 드리우며
스러져가는 노-올
수줍은 가슴에 활활
불을 질러 놓고 달아난다.
나는 또 한 해를 그렇게 살아왔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랑하며
푸른빛이 퇴색되어 가는
산천을 바라보며
사르르 돌아눕는 침묵 앞에
부끄러운 시어(詩語)
붉어지는 것을 보듬어 안고
삶이거니 하면서 달려왔다.
그러나
정작 내놓을 것이 없음은
어인 일인가.
더 사랑하지 못한 마음들이
휘감겨 쓸쓸하다.
찬바람이 갈대숲을
허겁지겁 빠져나가듯
우르르 밀려드는 고독 속을
나는 또 다시 빠져나가고 있다.
뒤돌아볼수록 아쉬운
세(歲) 밑에 서서
다음 해에는 조금 덜
아쉬워하기를 소망하며
아련한 꿈을 꾸고 있다.
-좋은글 중에서-